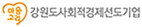2018 평창 패럴림픽 취재기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7-06 |
|---|---|---|---|
| 첨부파일 | [포맷변환]1530863814b974232ab2f342f40b90bbd8873ebd30.jpg | 조회수 | 7,530 |
 이와 같이 가까이에 있는 이웃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동행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날도 어느 순간 찾아올 것이라 믿는다. 4월20일 장애인의 날이다. 늘 그랬듯 인사치레뿐인 행사로 치를 것인가.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3월9일 평창올림픽스타디움.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대표팀 주장 한민수(48·강원도청)가 성화대 슬로프에 홀로 섰다. 의지할 수 있는 건 가느다란 로프와 의족 그리고 온전한 한쪽 다리뿐. 한 발 한 발 가파른 슬로프를 힘겹게 올라 마침내 다다른 정상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린 한민수의 모습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없다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뿜어냈다. 한민수의 멋진 성화 등반을 시작으로 전 세계 패럴림피안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훈련했던 결과들을 쏟아냈다. 외팔·외다리로 하얀 슬로프를 가로질러 내려오는 선수들의 모습은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경받기 충분했다. 비단 선수들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비장애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장애인 예술가들은 갈고닦은 실력들을 풀어놓았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예술의 경지’였다. 시각장애인 이소정양이 개회식에서 ‘파라보트(Para Boat)’를 타고 하늘로 올라 청아한 목소리로 부른 ‘내 마음 속 반짝이는’ 곡은 모두의 마음에 별로 남았고, 청각장애인 무용수 고아라가 소리 없는 세상에서 날아오를 듯한 몸짓을 펴냈을 땐 온 세상에 봄꽃이 만개했다. 올해로 제정 30주년을 맞은 ‘황연대 성취상’ 시상식도 특별했다. 이 상의 시발점이 된 황연대 여사가 남자 알파인스키의 아담 홀(31·뉴질랜드)과 여자 크로스컨트리스키의 시니 피(29·핀란드)에게 75g의 순금으로 제작한 메달을 수여했다. 또 그동안 황연대 성취상을 받았던 역대 수상자 5명이 소아마비 장애를 딛고 장애인 인권에 헌신한 황연대 여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메달을 걸어주며 감사 인사를 했다. 80세인 황연대 여사는 알츠하이머병(치매)과 3년째 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깊은 울림을 줬다. 동시에 인간 성취는 끝이 없음을 다시금 시사했다. 올림픽이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시켰다면, 패럴림픽은 우리사회가 잊고 있었던, 다시 말하자면 관심이 덜했던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을 되돌아보고 재정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무형적인 사회의식과 수준이 높아지는 계기다. 개최지역인 평창과 강릉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대거 확충하면서 무장애 도시로 거듭났다. 평창패럴림픽을 대비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인 식당이 230여 개소에 이르고, 숙박시설 21개소도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52개 객실을 구비했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국적,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편리하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다. 평창군은 음식점 101개소, 숙박업소 2개소에 대해 경사로를 설치하고 턱을 없애 장애인들이 쉽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입식 테이블을 갖추는 것은 물론 화장실 세면기 등에 스테인리스 봉을 설치하는 등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썼다. 특히 패럴림픽 기간 강원도를 찾는 장애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 편의지도를 제작했다. 평창패럴림픽조직위원회 역시 역대 대회 최초로 ‘접근성 전담팀’을 설치해 모두와 동행할 수 있는 사회로 진일보시켰다. 지금까지 취재현장을 다니면서 수많은 장애인들을 한 곳에서 본 적이 있었나 싶었다. 발달장애를 가진 청소년들,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들, 흰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시각장애인들이 패럴림픽 대회 경기장을 비롯해 문턱이 높았던 문화예술 전시·공연장에 가득 찼다. 장애인이 편해지니 아동과 노인에게도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이 갖춰졌다. 잠시나마 이동권이 보장되고 ‘누구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니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시설적인 변화는 단지 편안함만이 아닌 인식의 변화도 가져다 줬다. 소수인 그들을 바라보는 다수인 비장애인들의 눈빛도 달라졌다. 자신과의 다름을 보는 눈빛이 아닌 한 명의 소중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눈빛으로. 우리가 지향해야하고 가꿔나가야 하는 이상적인 사회모델은 먼 곳에 있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현장의 소식을 알리는 기자로서도 고민이 많았다. 무심결에 항상 써왔던 ‘장애를 극복하고’라는 표현을 두고 고심했다. 조심스러웠다. 국어사전에 표기된 ‘극복’은 악조건이나 고생 따위를 이겨낸다는 의미다. 극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장애’는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또 장애는 결코 극복할 수 없다. 이겨내는 대상이 아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표현을 써야 옳은 것일지 취재단들은 머리를 맞댔다. 결과, ‘장애를 뛰어넘어’ ‘장애로 인한 환경을 극복하고’ ‘신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로 의견이 모아졌다. 개운한 정답은 없었다. 다만 이를 계기로 기자들은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은 지극히 비장애인의 시각임을 배웠고, 앞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기사 작고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생각할 것이다.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리고 시쳇말로 이제 잔치는 끝났다. 패럴림픽대회가 우리사회에 넌지시 던진 공존과 동행의 무게, ‘같이의 가치’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가꿔나가며 유지시켜야 할지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국경을 넘고, 종교를 초월해 우정을 다졌고 파국으로 치닫던 세계정세도 북한의 올림픽 참여로 한시름 놓았다. 이와 같이 가까이에 있는 이웃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동행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날도 어느 순간 찾아올 것이라 믿는다. 4월20일 장애인의 날이다. 늘 그랬듯 인사치레뿐인 행사로 치를 것인가.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
|||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