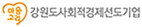[에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5-23 |
|---|---|---|---|
| 첨부파일 | 한_번도_보지_못한_밤.jpg | 조회수 | 657 |
|
한 번도 보지 못한 밤  누운 곳은 좁고 불편했다. 8, 90년대 관공서 로 비에서 볼법한 누런 돌바닥에는 한기가 돈다. 바닥에서 두 뼘 정도 높이에 불과한 철제 간이 침대에 누운 나는 ‘야전’과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들을 떠올렸다. 얼굴과 이름을 모르는사람들이 커튼을 사이에 두고 한방에 모여 있 다. 문 위에 있는 작은 유리창으로 복도에 하 얀 불빛이 새어 들어온다. 카트를 끌며 걷는 소 리, 아프다고 소리치는 소리, 무슨 말인지 알아 들을 수 없지만 고래고래 외치는 소리, 진통제놔드릴게요 같은 소리가 끊임없이 들린다. 환 자복을 입은 채 마스크를 쓴 아빠가 내가 누운 간이침대 옆 환자용 침대에 누워있다. 아무래 도 아빠도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인지 이마에 팔 등을 올린 채 눈을 감고 있다. 아빠의 폴립 제 거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하루 입원하는 날이 자, 아빠의 보호자 역할로 이곳 앞을 수없이 오 갔지만 정작 한 번도 간 적 없는 ‘기독병원’에서 의 첫날이었다. 병동은 □ 형태로, 안쪽에는 데스크와 공용화 장실, 세척실이 있고 바깥쪽에는 여러 개의 병 실과 한 개의 주방이 있다. 아빠와 내가 배정받 은 곳은 5호실로, 가림막이 있는 침대 여섯 개 와 텔레비전 한 개, 공용 세면대와 냉장고가 있 다. 각 침대 커튼에는 “커튼을 열어도 될까요?” 가 적힌 팻말이 걸려있다. 낮에 병실 배정을 받 고 짐을 풀 때까지만 해도 다가올 밤 풍경을 예 상하지 못했다. 팔목에는 병동을 출입할 수 있 는 바코드와 환자명, 보호자명이 적힌 종이 팔 찌를 찼다. 한때는 아빠가 나의 보호자였는데 이제는 처지가 뒤바뀌었다. 5호실 문 옆에 여섯 칸으로 나뉜 판에는 여섯 명의 환자 이름 일부 와 나이가 적혀있다. 40대부터 70대까지 고루 섞여 있다. 5호실 문 건너편에 공용화장실이 있 다. 처음 병실을 배정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화장실이 가까워 좋다고 생각했지만 몇 시간 채 지나지 않아 잘못 생각했음을 깨달았다. 화장 실 문은 늘 열려있고 누군가 볼일을 보는 소리 가 실시간으로 병실 안으로 밀려들었다. 마스크를 낀 채 앉을만한 의자도 없는 병실에 서 보내는 시간은 그야말로 ‘정신과 시간의 방’ 이었다. 코로나19 탓에 병원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병동 밖에는 그나마 넓은 대기실이나 복 도가 있어 가장 머무르기 좋다. 옥상 정원으로 나가는 문도 있었지만 동절기 한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굳게 잠겨있다. 옥상 정원 너머로 익숙 한 도시 풍경이 보인다. 항상 저 도시에서 병원 을 바라봤지, 병원에서 도시를 바라본 것은 처 음이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고 아 침을 맞았다. 아픈 사람,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 람,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찾 는다. 아빠는 불편한 간이침대에서 잔 나를 걱 정한다. 나는 이틀 동안 식사를 하지 못한 아빠 가 가엽다. 정오를 지나 퇴원 허가가 떨어지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한다. 이틀 동안 본 정경 도 옷더미와 함께 개킨다. 기진한 몸을 이끌고 마침내 병원 밖을 나선다. 우리가 기다린 것들 이 모두 그곳에 있었다. 글 이지은 지역문화콘텐츠협동조합 스토리한마당
|
|||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